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빠르게 현장 정착 중!
- 등록일
- 2016-11-29
- 조회
- 4,920
금년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정착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역시 확산 추세이나,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해결과제로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조사한 ‘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를 30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근거하여 ‘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13일부터 8월9일까지(4주간)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사업장 일반 현황,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유연근로제 실시 현황, 기타 평등기회와 기업문화 등 5개 영역의 총 80여개 문항으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임신 여성근로자의 보호 조치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⑤)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여성근로자 요구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근로기준법 제74조⑤)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임신여성근로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직종에 근무 금지(근로기준법 제65조)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신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를 원칙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여성근로자 청구시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⑦)
(출산후 시간외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의 1일 2시간 초과를 금지(근로기준법 제71조)
(총괄) 제도 인지도는 55%~70% 수준으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66.7%)가 가장 높고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65.6%)의 순
제도 도입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51.4%, 나머지 제도는 50% 미만이었으며, 제도 활용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 46.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4.9%의 순
(규모별)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임신중 시간외 근로금지는 5~9인 사업체에서는 ‘모른다’ 비율이 30%를 넘고(31.2%) 제도도입률이 20.3%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모른다’ 비율이 10% 이하(7%)이고 제도도입률은 80%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는 5~9인 사업체에서는 ‘모른다’ 비율이 20%를 넘고(24.3%) 제도도입률이 22.8%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모른다’ 비율이 5% 이하(4%)이고 제도도입률은 76%로 조사
(추세분석)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14.9월 도입, ’16.3월 300인 미만 확대)의 인지도는 ‘14년 51.4%에서 ’16년 66.7%로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이나, 제도도입률은 ‘15년 48.2%에서 ’16년 48.1%로 거의 동일
태아검진시간
(태아검진시간) 임신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총괄) 인지도는 58.6%이고 도입률 49.5%, 시행률 47.1%로 조사
(규모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인지도와 제도도입률에서 격차
5~9인 사업체의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은 각각 37.3%, 28.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각각 85.0%, 73.0%으로 격차가 큼
(추세분석) 인지도는 ‘14년 51.8%에서 ’16년 58.6%로 증가하고, 제도도입률은 ‘14년 40.9%에서 ’16년 49.5%로 증가
유.사산 휴가제도
(유.사산 휴가)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③)
(총괄) 인지도는 63.6%, 도입률 54.6%, 시행률 31.7%로 나타남
(규모별) 인지도는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체에서 41.3%, 300인 이상은 89.0%이며, 제도도입률은 5∼9인 사업체 28.6%, 300인 이상 사업체는 83.0%로 조사
(추세분석) 인지도는 ‘14년 57.2%에서 ’16년 63.6%로 증가하고 제도도입률은 ‘14년 44.2%에서 ’16년 54.6%로 증가
출산전후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 90일 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①)
(총괄) 인지도는 91.7%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제도도입률 및 시행률은 각각 80.2%, 68.3%로 조사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8.0%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이 35.7%, “대체인력 고용없이 부서 내에서 해결”하거나 “부서간 업무배치를 조정하여 해결한다”는 응답이 각각 32.2%, 24.8%
출산휴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는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1.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17.1%),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15.2%),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10.8%)의 순
(규모별) 5~9인 영세사업장의 제도인지도는 85.9%이나 도입률은 55.1%로 인지도와 도입률 간 격차가 매우 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인지도 97%, 도입률 98%로 인지도와 도입률이 유사
(추세분석) 제도 도입률이 지난 4년간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이 ‘13년 42.9%에서 ’16년 68.0%로 증가세가 뚜렷
수유시간과 수유시설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근로기준법 제75조)
(총괄) 수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2.7%이고,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6.8%로 수유공간보다는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
(규모별)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수유시설을 제공하는 비중이 45.0%이나 5~9인 사업체에서는 2.5%에 불과하여 격차가 큼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곳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49.0%이나 5~9인 사업체에서는 4.0%로 사업체 규모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
(추세분석) 지난 4년간 수유시설과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체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3일 유급)를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총괄) 인지도는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제도 도입률 60.8%, 제도 시행률은 46.1%로 점차 정착 중인 것으로 분석
(규모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인지도는 95%이고, 5~9인의 사업체는 66.7%로 사업체 규모별 인지도 격차가 있으며, 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하여 5∼9인 규모의 사업체는 34.1%이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제도 도입률은 92.0%
(추세분석) 지난 3년간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은 증가하는 추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운영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총괄) 인지도 82.0%, 도입률 58.3%, 시행률 59.0%로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대상이라는 사업체가 70%로 지속 개선 중 (‘14년 56.1%, ’15년 62.5%)
육아휴직기간은 평균 12.9개월로 법정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
“육아휴직 이후 원직복귀 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킨다”는 사업체가 73.1%였으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는 “휴직 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8%)과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6%)이 비슷하며,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가 과반수(51.8%)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51.4%),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순으로 조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인력부재(39.6%)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8.3%), ▲직무연속성 결여(10.6%)의 순
(규모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도입률은 93.0%이나 5~9인 소기업들에서는 26.8%로 기업규모간 격차가 매우 큼
(추세분석) 인지도와 제도도입률 모두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대상이라는 사업체 비율도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
(총괄) 인지도 66.0%, 도입률 37.8%, 시행률 27.2%로 조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복리후생은 전일제와 같다”는 사업체가 46.8%이고,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사업체가 33.9%로 조사
(규모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17%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68%
도입률도 기업규모에 따라 점차 커져 5-9인 사업장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이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60.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세분석)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인지도와 도입률은 선형으로 지속 증가 중인 것으로 분석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90일 휴직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2)
(총괄) 인지도 53.7%이고, 제도도입률 27.8%, 제도시행률 27.3%
(규모별)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9.0%이나 5-9인 사업체에서 36.6%이며, 제도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300인 이상 65%, 5-9인 7.6%)
추세분석) 인지도 및 제도도입률 모두 증가 추세
법정외 휴가제도
(병가) 업무 관련없는 근로자 질병에 대해 연차휴가일수 제외없이 별도 휴가를 부여
(난임휴가) 난임·불임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 제외없이 별도 휴가를 부여
(단기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차휴가일수 제외없이 30일미만의 휴가를 부여
(경조사 휴가) 본인·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시 휴가일수 제외없이 별도 휴가를 부여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일수 제외없이 특별휴가를 부여
(징검다리 휴일)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 사이의 평일에 휴가를 부여
(총괄) 경조사 휴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도입(98.9%)하여 유급운영(96.5%)을 하고 있었고, 병가제도도 대다수(70.4%)가 도입
그러나, 장기근속휴가나 징검다리휴일제도의 경우 도입비율이 낮은 편(각각 28%, 24.9%)이고,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각각 16.5%, 10.1%)
(규모별) 법정외 휴가제도의 도입률도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여 병가제도를 도입한 비율이 5-9인 규모 사업체에서는 62%이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4%에 이르며,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의 도입률은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5.8%이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36%
(추세분석) 대부분의 법정외 휴가제도의 도입률은 전년대비 증가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일정규모(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영육아보육법 제14조 등)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비율이 24%이나, 전체적으로는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직장보육시설 만족도는 만족 77.5%(300인 이상 83.3%), 불만족 2.5%(300인 이상 0%)로 비교적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냄
‘15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6%이었으나 ’16년에는 4.0%로 증가
유연근로제도의 활용
(시간선택제) 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짧은시간 근무하면서 전일제와 차별없는 근무(고용)형태
(시차출퇴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절하여 러시아워를 피하고 유연한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예> 8시 출근 17시 퇴근 등)
(탄력근로제)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선택‧조정하여 필요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제도(예>주4일제: 1일 10시간, 주40시간 근무 등)
(재량근무제)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프로젝트 완료시 일정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예> 연구보고서 완료시 월 200시간 근무로 간주 등)
(원격근무제) 주거지(자택), 또는 주거지 인근 등 근무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총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 비율이 21.9%로 ‘15년 조사결과(22.0%)와 거의 동일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의 실시비율이 각각 12% 내외로 높고 원격근무제·재량근무제가 3~4%로 낮음
유연근무제도에 대하여 비정규직근로자도 활용가능하다는 사업체 비율은 73.1%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산에 있어 어려움(1순위)은 ▲‘적합직무가 없어서’ 25.7%와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 25.3%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협의의 어려움’ 19.8%, ▲‘희망근로자가 없어서’ 19.0% 순
(규모별) 시간선택제 실시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33%이나 5-9인 사업체 6.2%로 나타나는 등 유연근무제 역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율이 높아지며, 모두 시행 안하는 비율은 300인 이상은 47%, 5-9인은 88%로 조사
(추세분석) 제도별로 다양하나, 지난 4년간의 증가추세는 시차출퇴근제와 원격근무제 도입에서 나타남
평등기회와 기업문화
(총괄) 사업체 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을 묻는 아래 6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의 척도값이 2.5(중간값) 미만이므로 대체적으로 인사관리의 성차별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드물다“는 응답률이 35%를 넘어 이 부문에서의 성차별적인 관행은 상대적으로 온존하고 있음을 시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로 ▲21.7%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꼽았고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 (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등의 순으로 조사
(규모별)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관리의 성차별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0%로 높은 반면(5-9인 19.2%),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로제 확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300인 이상 7%, 5-9인 16.7%)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이재국 (044-202-747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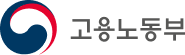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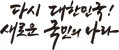
 국가상징 알아보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11.29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여성고용정책과)1.hwp
11.29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여성고용정책과)1.hwp